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칼럼·기고·주장
-
대중교통요금, 이제 손볼 때가 됐다
-
- 509
첨부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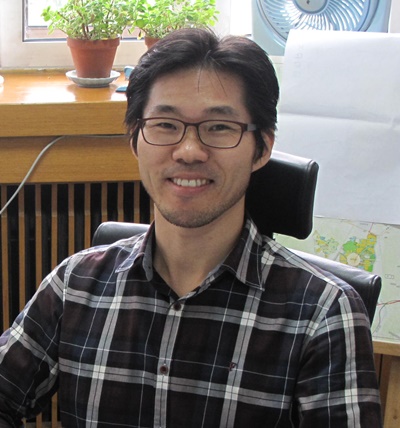
이재영(회원,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버스이용객은 2013년 하루평균 44만 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에는 40만 9000명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다른 수단과의 비교경쟁력을 나타내는 대중교통의 통행분담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대중교통의 이용객이 감소하거나 분담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대중교통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물리적 시설환경에서부터 사회적인 인구요인까지 다양하고 지역마다 다르다. 대중교통정책은 원인을 살펴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대중교통정책은 모든 도시가 비슷하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의 그것과 판박이다. 버스전용차로 도입, 준공영제와 무료 환승 요금제 도입이 그랬다. 이런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대전의 도시구조와 환경이 다르고 이용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치료방법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카드와 인구주택 총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서울과 대전은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다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39분인 반면 대전은 27분이다. 서울은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대전에서는 다른 대안의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이용자의 차이도 있다. 대전은 대중교통 이용자 중 여성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이용자의 연령특성도 뚜렷하다. 12세부터 점차 증가하여 22세까지 높아지다 다시 낮아지고, 이후 점차 높아져 68세에 가장 높다. 1인 가구의 비율도 26.1%로 전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대전은 이용시간이 짧다. 그리고 여성과 학생, 1인 가구, 고령자 즉, 사회경제적 약자이고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의 주이용층이다. 환경도 다르고 이용자도 다르다면 대중교통정책도 달라야 할 것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은 있겠지만, 요금정책에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적은 비용으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형평성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대중교통요금은 거리를 기반으로 시내 균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종류는 일반,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5~6가지에 불과하다. 종류가 단순하다 보니 다양한 통행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시간요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가족권, 특정요일 할인권, 동반권 등 요금을 다양화할 수 있고, 태그도 승차할 때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아지고 관리비용이 절감된다. 대전시와 같이 짧은 통행이 많은 도시에 유용하다. 무료 환승제도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장거리 이용자와 단거리 이용자 간에 요금이 역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세종시에서 출발하여 대전역까지 30㎞를 이용하는 사람은 1350원을 지불한다. 반면, 시내에서 짧은 1.9㎞ 구간을 왕복하면 2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어린이, 다자녀 이용자가 일반권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더 적게 발생하고 있다. 더 많이 갈아타야 유리한 요금구조에서 이들은 환승 횟수가 적고 이용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의 주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과 여성, 1인 가구 등에 대한 보다 큰 요금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이들은 대전시 대중교통의 주이용자들일 뿐 아니라 대중교통서비스는 국민 누구든지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이자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적은 이용층이 대중교통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인 것이다. 봄이다. 붐비지 않은 버스에서 테니스라켓을 무릎에 끼우고 책을 읽는 중년 아저씨 머리 위로 햇살이 떨어지고 있다. ** 이 글은 지난 3월 중도일보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